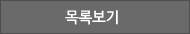- 신간 [피부경화증],[미시사, 100년 전 동아시아 의사들을 만나다]
- 병원뉴스 2010/02/01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정진호, 류마티스내과 송영욱 두 교수가 진료를 하면서 피부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질문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있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피부경화증은 아직 그 발생 원인을 모르는 질환입니다. 많은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치료법 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매우 다양하며, 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아직 없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가 느끼는 심신의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정진호, 류마티스내과 송영욱 두 교수가 진료를 하면서 피부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질문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있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피부경화증은 아직 그 발생 원인을 모르는 질환입니다. 많은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치료법 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매우 다양하며, 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아직 없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가 느끼는 심신의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오래 전부터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피부경화증에 대한 모든 것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부 증상에 대하여는 피부과 의사인 정진호 교수가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내과적 증상에 대하여는 류마티스 내과의 송영욱 교수가 마치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듯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총 3장으로 되어있으며, 피부경화증의 분류와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피부경화증의 두가지 형태인 국소피부경화증과 전신경화증의 피부증상, 내과적 증상, 그리고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와 보호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썼으나, 환자뿐만 아니라 피부경화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부경화증이란?>
피부 또는 내부 장기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내부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 경피증 이라고도 합니다. 딱딱해지는 이유는 피부나 내부 장기에 콜라겐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피부에 콜라겐이 많아지면 피부가 나무판을 만지는 것처럼 딱딱해지고, 색깔이 갈색으로 진해지거나 흰색이 되기도 합니다. 내부 장기에는 폐, 신장, 소화기관 등의 기능과 운동에 이상이 초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질환이 생깁니다.국소피부경화증은 피부 이외에 환자의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신경화증은 피부는 물론 내부 장기에도 병이 생기며,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신경화증은 미국의 경우 만명 당 1명꼴로 이 병을 앓고 있으며, 여성환자가 남성에 비해 2-5배 많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여성이 89%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15-40세에서는 여성의 발생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도서출판 하누리(T.2263-0971) 발간, 146쪽, 값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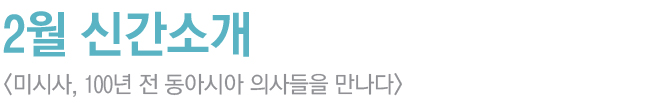
 한 나무에 달린 수천 개의 이파리들처럼 멀리서 보면 한가지로 보이던 것들도 가까이 다가서면 독특한 개성과 모양, 특성을 드러냅니다. 거기 이미 있었지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학에서 '미시사(微視史)'와 '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거시적 시각, 통설적 이해로는 볼 수 없던 풍부하고 깊은 역사상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제도나 문물 차원을 넘어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구체적인 개개인의 고민과 선택을 그려내려는 노력입니다.
한 나무에 달린 수천 개의 이파리들처럼 멀리서 보면 한가지로 보이던 것들도 가까이 다가서면 독특한 개성과 모양, 특성을 드러냅니다. 거기 이미 있었지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학에서 '미시사(微視史)'와 '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거시적 시각, 통설적 이해로는 볼 수 없던 풍부하고 깊은 역사상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제도나 문물 차원을 넘어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구체적인 개개인의 고민과 선택을 그려내려는 노력입니다.미시사의 창을 통해 100년 전 서양의학을 처음 배운 동아시아 의사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 10월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가 개최한 두 번째 병원사 국제심포지엄("동아시아 1세대 의사들의 생애: 미시사적 접근")의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입니다.
'제1부 미시사의 방법과 자료'에서는 '인물사'를 '미시사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자료를 다루었습니다. '제2부 동아시아 1세대 의사들을 찾아'에서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근대 직업인'으로 부상한 의사들이 헤쳐 나가야 했던 상황들을 조명하며 '전통'과 '근대'의 충돌을 미시적으로 살피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부의 첫 글 '역사, 이야기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공인 정신분석가 자격을 취득한 정신분석학자 정도언 교수(신경정신과)가 서구에서 정신분석학을 도입한 역사가들이 '정신역사학(psychohistory)'이라는 역사학의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흥미롭게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명한 역사가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에게서 정신분석을 받은 뒤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정신분석학을 역사학에 접목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청년 루터>는 청년기에 루터가 겪은 정체성의 위기를 종교개혁과 관련시켜 설명한 역작입니다. 피터 게이(Peter Gay)는 이미 중진 역사학자이던 50대 초반에 정신분석가 후보생으로 들어가 정신분석학을 정식으로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더 속이 단단한 역사를 더 포괄적으로 더 잘 쓰고 싶었던" 그는 정신분석 수련을 통해 사료들을 새롭게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정신분석이 "문화의 배경인 무의식적 환상,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며 객관성을 왜곡시키고 이성적 접근을 무력하게 하는 성적, 공격적인 힘들의, 숨겨져 있지만 강력한 흐름에 대해 내가 활발하고 민감하게 감수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 교수는 정신분석학적 방법들이 기존의 거시적인 역사가 포착하지 못한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하다며, 미시사 영역의 개척에 정신분석학을 도입할 것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구술사연구소 소장 윤택림 박사는 미시사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술사와 생애사를 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주관적인 감정, 의지, 신념들도 역사를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수집?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방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술자료 수집과 달리 고학력의 인텔리 층인 의사들에 대한 구술사료 수집에 필요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록관리학 분야를 앞장서서 개척해온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김익한 교수는 존스홉킨스의료원의 알랜 메이슨 체스니 메디컬 아카이브즈와 코넬대학병원의 아카이브즈와 같은 외국의 병원 아카이브즈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카이브즈가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록관리기관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역사 서술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 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문화복합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텍사스대학의 메간 윙게트 교수가 제시한 복합수집기관을 가리키는 라키비움(Larchivium, 라이브러리, 아카이브즈, 뮤지엄의 합성어) 개념을 도입해 병원 아카이브즈가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전문기관에서 수집과 관리, 전시, 편찬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고객 지향적이라는 조언입니다.
2부의 첫 글에서는 저명한 의료사가인 미국 벤틀리대학의 브라이디 A. 미너한(Bridie A. Minehan) 교수가 중국에 서양 의학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1세대 의사들이 겪은 고충을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에든버러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온 엘리트였지만 중국에 돌아와 선교의사로 활동하다가 동료 선교의사들로부터 인종 차별을 겪었던 웡푼(黃寬). 수많은 서양의학 서적을 번역하여 후배 의사들이 서양의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해준 1세대 의사이면서도 정작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의학회 정규 멤버는 되지 못했던 딩푸바오(丁福保), 그리고 난징 정부 시절 모자보건 분야에 큰 공을 세웠지만 공산당 집권 이후 피임과 출산통제를 주장하다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던 여의사 마리온 양(Marion Yang, 楊崇瑞). 이들의 경험은 강력한 국가가 의사의 양성과 활동 전반을 규제하는 후발 근대화의 상황 속에서 의사직이 하나의 자치적 전문직으로서 성장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력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경험은 어떠했을까요? 일본 와세다대학 가토 시게오(加藤茂生) 교수의 글은, 일본의 의사들이 근대의학의 수용에만 그치지 않고 진료 현장에서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선택을 했었음을 보여줍니다. 천황의 시의였지만 천황의 양의학에 대한 불신과 한의와의 대립 속에서 소신껏 진료하지 못했던 이케다 겐사이(池田兼齋). 양의사이면서 한의학의 장점과 양의학의 단점을 새롭게 부각하여 한방의학부흥운동의 이론적 기반까지 만들어 낸 와다 게이주로(和田啓十郞). 당시 양의학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을 경우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도입해 치료했던 가토 다카시(加藤橋)가 그들입니다. 의사들을 의료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보고, 그들이 어떻게 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 등을 선택하며 치료법을 구사했는지 밝혀가는 접근법도 흥미롭습니다.
대만 국립양밍대학의 푸 다이위(傅大爲) 교수는 식민지 근대성 문제에 '젠더'의 문제를 추가하여 인식 지평을 더욱 확대합니다. 가오징위안(高敬遠) 같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식민지 근대성의 권위와 남성 중심적 구조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반면, 차이아신(蔡阿信) 같은 여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우수한 교육을 받고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대 의학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경험은 우리나라 '신여성'들의 삶과도 겹쳐집니다. 또한 당시 산부인과 의사의 의료행위의 '대상'이었던 대만 여성들의 삶을 구술 자료를 통해 등장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전면에 드러낸 것도 이채롭습니다. 푸 교수는 "남자 의사를 옆에 두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며 치료를 거부"한 대만 여성들에 대해 '보수적'이고 '미개'하다는 평가는 부당하며, 이들이 얼마나 끊임없는 일상 노동과 출산으로 구조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처해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남성 중심의 식민지 근대화의 구조 속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삼는 비뇨기과에 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영역이 훨씬 발달했던 점도 주목됩니다.
병원역사문화센터의 이흥기 연구교수는 국권 상실을 전후로 한국인 1세대 의사들의 진로가 어떻게 갈렸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국가기구로의 진출이 막힌 뒤 '전통의학' 위주의 시장 속에서 '전통의학'과의 공존을 모색했던 국내 관립 의학교 출신자와 일본 학위자를 우대한 식민 체제 속에서 지역 개업의로서 성공하여 공직 활동에도 활발했던 일본 유학 출신자의 진로가 대비됩니다. 장기무(張基茂)는 의학교 제3회 졸업생으로 대한제국 말기 군의로 진출했지만, 군대 해산으로 해임된 뒤 매약업자 및 한의계와 맺은 관계를 통해 양의사이면서도 한방의학부흥운동의 선두에 서게까지 되었습니다. 한의학 가문 출신이면서 일찍이 일본 지바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강병옥(姜秉鈺)은 의사로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평남 도평의원, 중추원 참의라는 고위직에까지 오르며 식민지의 틀 안에서 조선인으로서 성장을 도모했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이력에서 당시 식민지를 통과하며 성장 발전해야 했던 한국 의학사의 고민과 역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편, 2009, 태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