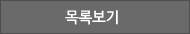- 환자의 연명치료여부, 대부분 임종 임박해서 가족이 결정
- 최신의학정보 2013/06/01
- 입원 전 사전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던 환자는 6.3%불과
- 본인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는 0.6%이고,
99.4%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가족들이 결정 (자녀, 배우자 순)
- 연명의료결정이 늦어져, 대부분 호스피스-완화의료 혜택 받지 못하고 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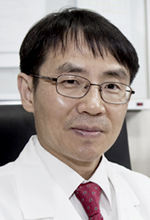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사진)(오도연, 이준구, 안아름, 최연악, 김범석, 이세훈, 임석아 공동연구)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5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6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사진)(오도연, 이준구, 안아름, 최연악, 김범석, 이세훈, 임석아 공동연구)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5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6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635명 중 528명 (83.1%) 의 환자에서 임종 전 1주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인공호흡기 중단을 결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중단 후에도 200일 이상 생존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사망 2-3일전에 연명의료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635명의 환자 중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4명 (0.6%) 이었고, 99.4%(631명)에서 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가족관계가 명확히 조사된 231명 중 자녀 48.4%(112명), 배우자 43.3%(100명), 부모 2.6%(6명), 기타가족 5.6%(13명)가 가족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연명의료결정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병실에 입원했던 114명의 진행기 혹은 임종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7%(100명)에서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이나 연명의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환자본인도 4.4%(5명)에서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화가 가능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7.9%(9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임종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대부분의 가족들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완화의료병동에서 임종한 20명의 암환자 가족에 대하여, 호스피스팀 (이영숙, 홍진의, 최형옥, 서영주) 이 가족 내 의사소통여부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7 가족(35%)에서만 환자와 가족이 운명을 수용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고, 나머지 13 가족(65%)에서는 임종이 임박했음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환자와 가족 사이에 임종에 대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임종기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명의료 시행여부도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2010년 8월1일부터 2011년 7월31일 사이 입원하여 사망한 환자 176명 별도 분석한 결과, 입원하여 임종한 암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입원 전에 사전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환자는 6.3%(11명)였고, 입원 후에 작성한 환자는 80.7%(142명)였으며, 13.1%(23명)의 환자는 사망 시까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환자들은 작성한 환자에 비하여 중환자실 사망이 더 많았고 (65.2% vs 15.0%), 인공호흡기 (65.2% vs 14.4%) 및 심폐소생술 (65.5% vs 1.3%)도 더 많이 시행 받았습니다.
허대석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5월29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